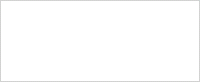▲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일주일간 이어진 화마에 울창하던 소나무 숲이 잿더미가 됐다.
소나무는 1970년대 정부의 조림 사업에 따라 전국 각지에 심어졌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산림 복원이 빨랐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산림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해,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많다.
하지만, 산불이 났을 땐 큰 피해를 불러온다.
송진 등이 불에 잘 타는 데다 건조한 봄에도 잎이 붙어 있어, 일단 산불이 나면 활엽수보다 더 강하게, 오래 탄다.
'나무 심기' 위주의 조림 사업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솎아내지 못한 고사목 등이 산불의 연료가 됐고, 높은 밀도 탓에 불은 더 쉽게 번졌다.
경남 산청의 경우 낙엽이 성인 허리 높이까지 쌓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숲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침엽수림 일부를 불에 강한 내화 수종으로 대체해 '불막이 숲'을 조성하거나,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간벌해야 한다는 거다.
불막이 숲 조성 같은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는 산주들의 동의와 함께 예산 확보 등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산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이 주요 관광 거점시설들을 확충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의 핵심인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25년 9월) △장생포 문화창고 경관개선 사업(25년 12월) 완...
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이 주요 관광 거점시설들을 확충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의 핵심인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25년 9월) △장생포 문화창고 경관개선 사업(25년 12월)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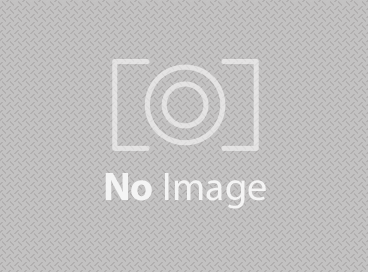 뉴스21 기자단 해직 공지
뉴스21 기자단 해직 공지

 목록으로
목록으로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개선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개선법' 대표 발의
 김종훈 시의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련 간담회
김종훈 시의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련 간담회
 정읍시 칠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정읍시 칠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주민안전 위해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마련 필요”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주민안전 위해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마련 필요”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현대공업고, 올해 졸업생 취업률 94% 달성
현대공업고, 올해 졸업생 취업률 94% 달성